-
안 해] by 심채경 [천문학자는 별을 본다]카테고리 없음 2021. 4. 13. 19:24
문학동네 웹진을 보다가 '심채경' 천문학자의 글을 처음 봤다. 천문학자가 쓴 에세이라니! 식물학자가 쓴 수필이었던 '랩 걸'도 생각나서 재미있을 것 같았다. 우주 관련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섞어 놓은 글이 정말 흥미로웠고, 글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몇 편씩 읽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책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바로 서점에 가서 구매하게 되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웹진으로 읽을 때보다 책으로 읽는 감동이 좀 덜했다. 편집 과정에서 문장이 짜깁기돼 크게 수정된 것 같았다. 표지도 엉망으로 잘 뜯겨서 안이 깨끗하지가 않았다.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 아쉬웠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 글이 나와서 만족스럽게 책을 덮을 수 있었다. 우주와 별이라는 소재 자체가 어떤 글을 써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다고 느꼈다. 내가 정말 모르는 분야라서 더 흥미로웠다. 특히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가 잘 모르는 우주에 관한 지식을 삶의 교훈으로 풀어내는 글들이 나와서 참 좋았다.
p.31 떠난 사람들은 못 남은 것이 아니라 남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고, 남은 사람들은 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면 된다는 걸. 파도를 이기든 지든 보는 경험이 나를 숙련된 뱃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걸.
p. 390보다 작은 손을 쉽게 빼지 못하는 학생과 멈춰 있는 축구공도 제대로 못 차는 내가 뭐가 다른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예체능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과목으로 우주의 이해를 가르치면서 작가가 쓴 말. 나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
p.63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다니는 치고는 너무 높은 개인적 비용과 시간을 내는 대학생들 대학이 쿠루 쿠루에 " 배운 것"보다 배우는 즐거움과 고통을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가질 보람을 되새기기 바란다.
이 글 전체가 좋았는데 나도 이 글을 읽고 '고등학교 교육 목표가 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대학이 사실은 '학문'을 닦는 곳이라는 것을 나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하면서 자신만의 이론과 생각을 정립하는 일. 그것이 대학의 추구 목표다. 결국 이를 위해 영어로 된 논문 등을 고교 교육과정에서 미리 읽어보고 대학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는 것이었다. 필요에 따른 교육, 취업을 위한, 혹은 대학입시 교육 생각만 하다가 나도 눈을 떴다. 그동안 수능 영어 문제 욕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걸 읽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건네주곤 했는데 아이들에게 미리 대학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하니 수능 문제만 항상 풀고 있는 최근 고3 수업에서도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자 몇몇 아이들은 대학 가기 싫다고 말했고 몇몇 아이들은 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면 알지, 애들도
p.156 보이저는 창백한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더 멀리, 통신도 닿지 않고, 누구의 지령도 받지 않는 곳으로. 보이저는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진할 것이다. 지구에서 반출한 연료는 바닥났다. 태양의 중력은 점점 가벼워지고 빛마저도 너무 희미해져 간다. 춥고 어둡고 드넓은 우주로 묵묵히 나아간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각자의 우주를 만들어간다. 맞아, 어른이 될 거야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 설명한 글이었다. 자식으로서 내가 느끼는 죄책감과 부모로서 엄마와 아빠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잘 그린 글이라고 생각하고 밑줄을 그게 됐다. 난 나만의 우주를 만들어갈 거야 그 과정에서 내가 느껴야 할 것은 죄책감보다는 나라는 우주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덕분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 정도 되는 거 같아
p.162 걷거나 의자를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일몰을 오래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수성이다. 그곳의 하루는 매우 길어서 해가 뜰 때부터 저물 때까지 88일이나 걸린다. 해가 지면 88일간의 긴 밤이 시작된다.
문학적 상상력을 크게 자극하는 부분이었다. 88일 낮과 밤이란...
p.163 아침 알람을 끄고 나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빈사 상태로 이불 속에서 괴로워할 때 해가 두 번째 뜰 때까지 한잠 더 잘 수 있다면 그 잠은 얼마나 달콤할까. 수성의 시인들은 두 번의 일출과 두 번의 일몰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첫 번째 일몰과 두 번째 일몰 시간을 소설가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아이들은 나쁜 마법사가 첫 번째 일몰을 두 번째 일몰로 착각하고 엉뚱한 주문을 거는 바람에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공주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잠들까?
너무 낭만적이야. 이 작가님의 세계는 나보다 얼마나 넓을까? 우주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일이야.
p.170 랑데부 : 우주를 유영하는 두 물체가 접촉하는 것숨막히는 어둠 속을 조용히 떠돌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 옆에 라디오를 가진 작은 우주선 친구를 붙여주는 것이다. 라디오는 지구의 신호를 우주선에 보내고 우주선이 이 돌멩이에 대해 발견한 것을 다시 지구로 송신한다.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소행성의 궤도에 발을 맞추는 랑데부다.
랑데부라는 말은 자주 들었지만 정확한 의미는 처음 알고 흥미로웠다.
p .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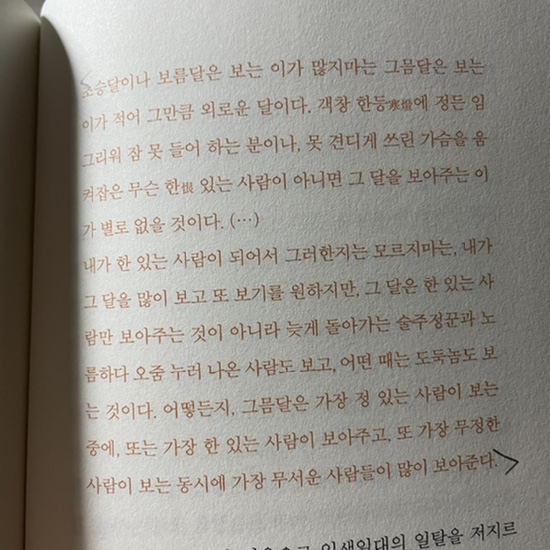
p.244 뉴호라이즌스의 책임연구자 앨런 스턴 버사는 지금도 명왕성을 행성으로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가 명왕성을 행성으로 부르든 왜소행성으로 부르든 134340으로 부르든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림당하고 소외되며 존재 자체를 위협받는 자의 심정을 명왕성으로 이입시키든 말든 명왕성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 멀고 어둡고 추운 곳에서 하트 모양처럼 보여 지구인들에게만은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얼음 평원 스푸트니크를 아낀 채 태양으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중력의 끈을 쥐고 있을 뿐이다. [...]명왕성, 그리고 자기보다 작은 많은 위성 친구들과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오래도록 멈추지 않는 자신들만의 왈츠를 추고 있을 뿐이다. p . 253

p.270 무엇이 되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사는 나에게 일러주었다. 그래서 안개 속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글을 썼다. 그래서 '있는' 책이 될 수는 있었다. 이 책의 작가가 터무니없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과학자 같은 느낌으로 쓴 책은 아니어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우리처럼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나아가 열심히 사는 한 사람의 직업, 여성, 인간이 쓴 글이어서 더 좋았다. 작은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 느끼는 생각이 우주 전체, 인류 같은 거대하기 때문에 또 좋았다. 앞으로 별을 볼 때마다 이 책이 떠오를 것 같다. 그리고 원래 좋아했는데 별이 더 좋아질 것 같아.